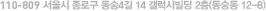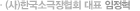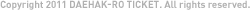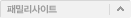매거진
대티기자단
매거진
대티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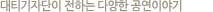
 극단 연우무대의 <일곱집매>, 현재진행형의 아픈 역사를 나누다
극단 연우무대의 <일곱집매>, 현재진행형의 아픈 역사를 나누다-
 최고 관리자
최고 관리자
 2013-07-08
2013-07-08
 7939
7939

‘승자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모든 역사는 승리한 자들에 의해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록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힘없는 자들은 잊혀져간다. 극단 연우무대의 연극 <일곱집매>는 무심한 사회 속 잊혀져가는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리고 젊은 선생, 내 이름을 실명으로 써줘요.”
무대에 조명이 켜지면 일곱 개의 문이 다닥다닥 달려있는 한 집이 보인다. 일곱 집이 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서 지어졌다는 안정리의 옛 이름 ‘일곱집매’를 형상화한 무대다. 아름답던 평택의 작은 마을은 미군기지인 캠프험프리가 지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기지촌’으로 변해갔다. 미군들을 상대하는 클럽이 들어서고, 생활을 위해 불우한 소녀들이 모여들었다. 그녀들이 접대를 통해 벌어들이는 미화는 한 가정의 생활비였고, 한 국가의 외화벌이 수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는 그녀들을 ‘애국자’라 추켜올리며 복지를 약속했지만, 사회는 그들을 ‘양공주’라 부르며 격리시켰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모르는 척 하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가 된 그녀들의 삶속엔 수많은 사람들이 발자취를 남겼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함께 밤을 보낸 수많은 미군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 땅속에 묻히고, 멸시받거나 혹은 먼 이국땅으로 입양되어간 혼혈 아이들, 성병을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죽어간 소녀들과 취재 온 기자들. 처음엔 주인공 ‘고하나’도 그저 논문에 실을 인터뷰를 위해 안정리를 찾은 한 사람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곳을 찾은 첫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한 하나는 자신에게 순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부족했음을 깨닫는다.

하나는 더 이상 순영할머니를 재촉하지 않았다. 전쟁과 인권 박물관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보고, 동두천을 찾아가 기지촌 여성들의 증언을 듣고, 안정리의 기지촌에서 생활하는 필리핀 여성 써니에게 조언을 하면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한다. 순영 할머니는 ‘기록하고 기억하겠다.’고 말하는 하나에게 마음속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낸다.
‘아픔은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할 때 치유가 된다.’
이 연극은 우리에게 역사를 공부하라 말하지 않는다. 사회의 멸시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입양 보내야 했던 순영 할머니,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의 기지촌에 흘러들어온 필리핀 여성 써니, 미군기지 철수 운동을 하는 상철과 미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춘권 그리고 아픈 가족사를 간직한 채 논문을 준비하는 하나. 각자의 아픔을 간직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억해 달라고 말할 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Impossible Distance(닿을 수 없는 거리)'가 있다고 한다. 덕분에 우리는 타인의 슬픔을 모두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연극을 보고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모든 슬픔을 공유하지는 못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픔은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할 때 치유가 된다.’는 프로그램 첫 머리의 글처럼 우리가 이 연극을 보고 느끼는 공감과 연민이 전해져 할머니들의 마음 깊은 곳 슬픔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기를 바란다.
글_ 대학로티켓닷컴 대학생 기자단 3기 권하림 nimp0729@naver.com
사진제공_ 극단 연우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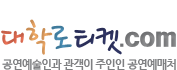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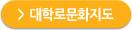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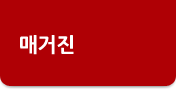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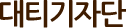
 이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