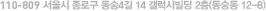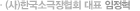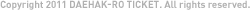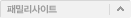매거진
웹진TTIS
매거진
웹진TTIS

 세 사람 있어!
세 사람 있어!-
 최고 관리자
최고 관리자
 2012-10-20
2012-10-20
 7562
7562
세 사람 있어!
이예은 (동덕여대, 계원예대 강사)
metaism@naver.com
관극일: 2012.10.15
작·연출: 타다 준노스케
극단: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도쿄데쓰락
공연 장소: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공연 기간: 2012.10.11-10.21
'나'의 방 안에 또 다른 ‘나’가 등장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누구냐고 묻는다. 각자가 자신이 ‘나’라고 주장하며 말싸움을 하는 동안 또 한 명의 ‘나’가 등장한다. 결국 무대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여 서로가 누구냐며 묻고, 이 어지러운 말싸움을 보는 관객들은 곧 알게 된다. 이 말싸움은 사실적인 싸움이 아니라 연극‘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연극은 ‘나-cogito’라는 존재를 둘러싼 메타포를 다루는 연극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관객들은 이 기이한 말싸움을 바라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인물들의 대사 내용을 따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대사의 내용을 좇아가지 않고, 대사들이 충돌하고 각자 길을 잃어가는 방법과 양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막에서 이 세 사람은 한 사람의 존재를 두고 싸우고 있는 듯 보이다가 이어지는 두 번째 막에서는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씩 서로 짝을 바꾸어 가며 각자가 각자의 그림자인 것처럼 그림자놀이를 한다. 세 사람 가운데 짝을 짓는 두 명의 그룹도 계속 변화한다. 그래서 이 방에는 세 사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 사람 외에 보이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어 도합 네 사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세 사람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든다. 느낌표의 표기 때문인지 어딘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한 이 작품의 제목 ‘세 사람 있어!’의 의미가 무대 위에 등장한 세 사람에 대한 존재 여부를 캐묻는 문장으로 다가오는 대목이다.
첫 번째 막에서는 서로 누가 ‘나’인지를 두고 싸우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막에서는 이 방에 ‘몇 사람이 있는지’가 논란의 화두가 된다. 첫 번째 막에서 ‘나’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한 세 인물들은 두 번째 막에서는 더 이상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연연해하지 않고, 그 다음의 문제를 해명하려 든다. 이들의 싸움은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공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답이 존재하는)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행위처럼 보이기도 한다. 세 명(3)이라는 가시적인 완전수를 두고 이런 저런 가변수를 실험하고 계산하여 답을 풀어내고자 하는 수학적 행위. 그러나 관객들은 이 머리 아픈 수학적 수식 풀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금방 흥미를 잃게 된다. 두 번째 막에서도 역시 관객들은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핑퐁식 숨바꼭질 놀이의 순서와 질서를 좇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이내 이들이 각자 항변하는 머리 아픈 대사들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이들의 옹졸한 대사들은 편협한 주장을 더할수록 모호한 형체로 뭉개지고, 그래서 우리는 대사 대신 이들이 만들어내는 동선과 움직임에서 장면의 의미를 파악하려 든다.
이 연극을 계속 바라보고 있노라면 누가 누구의 그림자이고, 누가 누구와 쌍을 이루어 움직이는지의 문제보다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가능케 한 사정없는 충돌과 혼돈의 유희 자체가 눈에 들어온다. 단지 눈에 보이게 만듦으로써 기이해졌을 뿐, 그것은 사실 일상적으로 늘 존재하는 우리 안의 숱한 분열과 싸움들의 형태이다. 타다 준노스케는 그것이 ‘연극’이기 때문에 전달이 가능한 어떠한 혼돈과 충돌의 힘을 보여준다. 이 점은 그가 연출했던 또 다른 작품 <재/생>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일관된 힘이었다. 시간의 흔들림, 시간이 만들어냈던 어느 한 장면의 흔들림, 나와 나 사이의 흔들림, 그리고 기억 속의 나와 너 사이의 흔들림, 그래서 만들어진 지금의 너와 나 사이의 흔들림 같은 것들.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는 보편적인 흔들림을 준노스케는 지극히 가시적인 배우들의 동선과 싸움, 그리고 지극히 옹졸한 대사들의 엉김으로 끌고 감으로써 매우 추상적인 문제를 매우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준노스케는 우리에게 추상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으로 다가왔을 때 얼마나 그것이 충격을 줄 수 있는가를 체험케 한다. 의례히 알고 있는 시간의 유동적인 감각, 자아의 유동적인 감각이 물리적인 상상력으로 구현되었을 때 실은 그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부조리한 것인가를 말이다. <재/생>에서 같은 장면을 다른 시간과 조합하여 세 번 ‘재생’해서 보여줄 때 관객들이 경험하는 같음과 다름 사이의 간극이랄지, <세 사람 있어!>에서 한 사람의 분열된 자아가 만들어내는 싸움을 보여줄 때 관객들이 체험하게 되는 기이함 같은 것이 바로 준노스케의 연극이 만들어내는 연극적 충격이다.
이 작품에서 보여준 자기 분열적 싸움은 작품의 후반부에 가면서 보다 그 성격이 명확해진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세 명의 배우가 모두 무대를 퇴장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얼마간 텅 비어 있는 무대를 응시하게 만들었던 장면이다. 이전까지의 장면에서도 계속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 수 없게 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있는 무대를 응시하게 했을 때 비로소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과 허위,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간극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아쉬웠던 점은 이 장면에서 사운드로만 처리되었던 인물들의 대사가 MR이 아닌 육성으로 연출되었더라면 하는 점이다. 텅 비어 있는 무대 안에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인물들의 존재감에 보다 질감 있는 목소리를 주었더라면 ‘보이지 않는 생생함’이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이들이 왜 그토록 자기 분열적인 싸움을 했는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에필로그이면서 커튼콜의 일부이기도 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세 인물은 언제 서로를 향해 대사를 나누었느냐는 듯이 각자 저마다 ‘너무도 확고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 와 서로를 외면하며 제 할 일을 한다. 그제야 비로소 이 방 안에 있는 오브제들-컵라면과 만화책, 노트북, 핸드폰은 모두 너무도 확고한 자기 자신 속에 함몰된, 외톨이가 된 사람들의 공간을 장악하는 소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대목에서 이 작품은 이토록 외로운 오브제들과 비벼대며 지독히 홀로 묻혀 지낸 ‘한’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 독백으로 다가온다. 세 사람이 등장해서 열렬하게 싸웠던 그 작고 뜨거운 무대의 모든 열기는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온데 간데 없이 기화되고, 대신 오롯이 쓸쓸한 외로움의 냉기가 그 자리를 가득 채운다.
준노스케가 보여주는 세계에 대한 질문과 문제의식, 그리고 위트는 그것이 지극히 보편적이고 묵직한 중량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할 정도로 가시적이고 끈기 있게 그려진다.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매우 좁고 선명하고 길쭉한 형체를 지닌 연극적 경험을 하게 만든다. 이것이 준노스케가 보여주는 연극적 생명력이다. 극장 안에서 누구의 것이 되었든 ‘어떠한’ 상상력이 ‘누군가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연극을 만질 수 있게 된다. 아주 큰 것이 아주 작은 것으로 만져질 때 우리는 (마치 사람을 경험하듯) 연극을 경험한다. 뜨겁게 흔들렸다가 차갑게 고착되는 세 명 혹은 한 명의 인물을 보여준 <세 사람 있어!>는 좁디좁은 소극장 안에서 매우 선연한 기온의 편차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작은 연극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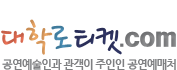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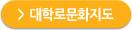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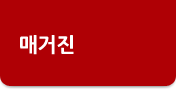




 이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