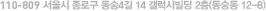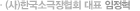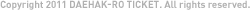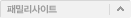매거진
웹진TTIS
매거진
웹진TTIS

 연극 <키사라기 미키짱>
연극 <키사라기 미키짱>-
 최고 관리자
최고 관리자
 2012-05-20
2012-05-20
 7485
7485
연극 <키사라기 미키짱>
이예은
제목 : <키사라기 미키짱>
극작 : 코사와 료타
연출 : 이해제
출연 : 이율, 권재원, 최재섭, 윤정렬, 이인호
공연 기간 : 2012. 4. 28~6. 30
공연장 : 예술마당 2관
아이돌 여가수 키사라기 미키짱의 죽음을 추도하기 위해 모인 인터넷 팬 까페 회원 다섯 명이 극을 끌고 간다. 단지 미키짱 팬인 줄로만 알았던 그들은 제각기 그녀의 죽음과 연루된 용의자로 드러나고, 그와 동시에 초반부에 이들이 꺼내어 보여준 미키짱과 관련된 물건들은 그녀를 죽인 단서들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이 다섯 남자는 단지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에 관련된 인물들로 다시 발견되면서 극은 다시 한 번 반전을 맞이한다.
이 작품은 미키짱의 죽음과 삶을 둘러싼 다섯 개의 비밀, 다섯 개의 반전, 그리고 다섯 명의 삶을 보여준다. 사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무대에는 등장하지 않는 키사라기 미키짱이다. 무대에 선 다섯 명의 남자는 그녀를 둘러싼 조연들로서 극을 이끌어간다. 그런데 극을 계속 보다보면 어쩌면 그들의 한 가운데에 있는 미키짱이라는 실재하지 않는 여주인공은 원래부터 이들 마음 속 한켠에 있는 추상적인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섯 남자의 정체가 모두 밝혀지고 서로가 화해를 하는 엔딩 장면에서는 무대 한 가운데에 오롯이 밝고 노란 조명이 들어차는데, 이 빛은 작품의 전체 맥락 안에서 볼 때 서글프리만큼 비현실적이다. 이 작품은 실재하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리라 믿는 어느 희망을 조명하며 끝을 맺는다.
이 작품은 일본 코사와 료타의 극본을 번안 각색하여 이해제 연출이 작년 5월 초연을 선보였고, 올해 4월 재공연을 시작했다.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야 하는 장기 공연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였는지, 고정된 배우들의 호흡으로 단련된 팀제가 아니라 다섯 배역의 더블 내지 트리플로 섭외된 열 명 남짓하는 배우들이 매번 정해지지 않은 조합으로 서로 호흡을 맞추어 가며 공연을 한다.
대본, 무대-조명-음향 연출, 인물, 동선, 심지어는 애드립마저도 초연 공연의 문법을 거의 그대로 재연하여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연은 왜 이토록 다른 공연이 된 것일까? 그토록 ‘같은’ 것을 보여주는데도 공연은 어쩌면 이토록 ‘다른’ 것일까? 이 글은 이 작품의 초연과 재공연 사이에 존재하는 돌처럼 낯선 간극에 대한 상념이다.
이 연극의 힘은 반전에 있다. 그러나 그 반전은 단지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결과물로서의 반전이 아니라 각 인물들이 보여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의 순간으로서의 반전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단지 비밀을 풀어 보여주는 해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답에 다가서기까지의 다섯 명 인물이 경험하는 긴장되고 고조되는 발견과 통증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의 웃음은 통증을 수반한 웃음이다. 이야기의 구조 안에 담긴 반전은 사실 이 작품 속에 내재된 웃음과 울음이라는 감정 사이의 반전을 유발하는 어떤 것이다. 이 작품에 내재된 웃음은 결코 웃음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 작품 속의 웃음은 아이러니한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 웃음을 ‘많이’ 주는 버전을 만들기를 원했다면 이 작품은 실패이다. 웃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웃음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피상적인 웃음이냐 아니면 진정한 웃음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결코 웃음의 양은 웃음의 질과 반비례하지 않는다. 관객들은 안다. ‘진짜’ 웃을 수 있는 힘은 정말이지 어떠한 ‘힘’이라는 것을.
이 작품의 생명력은 내러티브가 지닌 충만한 역동성을 배우들이 마치 운동선수처럼 쉼 없이 좇아가고 부대끼며 활동하는 것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영화로 볼 때보다 연극으로 볼 때 내러티브의 그 역동적인 측면들이 배우의 몸과 몸 사이에서 되살아나면서 보다 진짜가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 2003년 연극으로 초연된 이래 영화로 제작되어 2008년 국내에서 상영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대본이 지닌 내러티브의 힘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초연 공연에서의 몸과 동선만을 바쁘게 흉내 내고 있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같은 움직임, 같은 동선이라도 에너지가 다른 것이다. 이번 버전의 공연에서는 몸과 몸들만 있을 뿐, 몸과 몸 사이는 사라졌다.
같은 대사, 같은 대본, 같은 동선, 같은 비주얼인데도 내러티브의 생명력과 인물들의 활기가 이토록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공연을 만드는 진짜 요소란 이러한 물리적인 기호들 사이 사이에 존재하는 비물리적인 힘이어서가 아닐까? 우리는 그토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급급해 하며 공연을 따라가지만, 그 공연에서 전해지는 에너지란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사이의 어느 공백과 침묵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모른다. 그것도 한 두 명의 관객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명료하고 전반적인 힘으로서 말이다. 예를 들어 키무라 타쿠야가 “사랑했었어.”라고 외칠 때라던지 딸기 소녀가 “그 애의 인생을 망쳐버린 건 나야.”라고 절규하며 쓰러질 때와 같은 어느 순간을 만들어 내는 힘 같은 것 말이다. 어느 캐릭터의 결정적인 내면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은 그 대사의 내용이나 기능, 위치 같은 것이 아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 대사를 세우는 것은 대사를 읊는 순간에 담긴 배우의 에너지이다. 공연을 보는 동안의 관객과 배우, 객석과 무대 사이를 채우는 시간은 이러한 에너지들에 휩싸여 있다.
연극 매체는 관객과 배우 사이의 상호 작용의 힘을 믿는 매체라고 하지만, 연극에서의 관객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저마다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공연장까지 발걸음을 한 관객은 기본적으로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것들에라도 촉각을 세우고 언제라도 웃고 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호의적인 대중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관객은 무대에 이끌려 가게 마련이다. 단지 관객이 이끌려가는 것은 어느 물리적인 것들의 힘이 아니라 내면적인 힘이라는 것이다. 내면을 울리는 힘이 아니라면 관객은 수동이 아닌 피동의 객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초연 공연의 내면적인 힘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깊은 감동과 애정을 느꼈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다섯 달이라는 긴 시간을 앞둔 <키사라기 미키짱> 재공연이 나날이 깊어지고 채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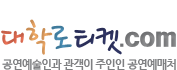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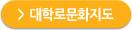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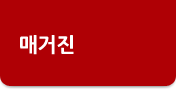




 이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