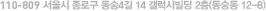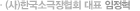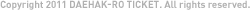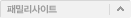매거진
대티기자단
매거진
대티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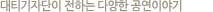
 삶에 지치는 이 순간, 지금 뒤를 돌아보라. 연극 <동행>
삶에 지치는 이 순간, 지금 뒤를 돌아보라. 연극 <동행>-
 최고 관리자
최고 관리자
 2012-09-21
2012-09-21
 10272
10272

삶에 지치는 이 순간, 지금 뒤를 돌아보라. 연극 <동행>
지난 14일, 소극장 산울림 개관 27주년 기념 세 번째 무대가 열렸다. 연극의 제목은 <동행>으로, <한 번만 사랑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에 이은 마지막 이야기인 이 작품은 일명 “실버 연극”으로서 노년의 두 남녀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최근 노년의 삶을 조명하는 작품이 다수 나오고 있어 그리 신기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불어온 복고신드롬에 따르듯 혹은 언제나 우리들 곁에 자리하고 있는 지난 젊은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첫사랑”이 본 작품에서도 주요 소재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연극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부하지만 진부할 수 없는 연극‘ 왜냐하면 이 작품은 바로 ’사람‘과 ’삶‘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른 삶, 같은 기억의 두 남녀 그리고 재회
첫사랑은 그 단어만으로도 아련하다. 설령 그 사랑이 이루어졌든 아니든 아주 오랜 삶을 흘려보내고 난 뒤 돌아보았을 때, 그 것은 ‘나‘를 다시 설레게 한다. 여기 무대 위에 두 남녀가 있다. 그들은 각자 각각의 사연으로 요양원에 들어와 홀로 살고 있었다. 노년의 여자는 우연히 운동을 하며 지나가던 공원에서 쓰러진 남자를 만난다. 서로 전혀 몰랐으나 두 사람은 같은 요양원에 살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대화한다. 죽음에 대해 초연할 수밖에 없는 노년의 나이. 특히 남자는 삶에 대해 큰 의지가 없다. 그는 말한다. “아침에 눈을 또 뜨면 그렇게 생각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지. 아아. 정말 끔찍해.” 남자는 결국 아내가 작년에 자살했음을 고백한다.
여자는 요양원 간호사로부터 남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불치병이던 아내가 자신을 간호하는 노년의 남편을 보다가 이윽고 그가 자는 사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한 것이다. 여자는 남자를 안타까워한다. 남자 역시 여자와 서로 말동무를 하면서 그녀가 보내온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그 와중에 남자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여자의 얼굴을 보며 결국 이미 오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하여 낡은 옛 기억을 떠올린다.남자는 의사로부터 여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요양원에 오면서 젊은 시절의 기억을 잃었음을 듣는다. 그리고 남자는 그녀로 하여금 꺾였던 삶의 의지를 다시 가지게 되었다.

내가 정말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능력이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내 안에 담아두고 항상 꺼내 볼 수 있는 것만큼 설레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국 인간의 ‘삶’의 궤적을 완성한다. 물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만큼 기억도 낡아진다. 그럼에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지난 시절을 추억하는 데는 꼭 사람의 기억만이 전부는 아니다. 아주 사소한 꽃 향기, 기차 소리조차 그 때를 떠올리게 한다.
남자는 젊은 시절의 기억만을 잃어버린 여자에게 백합꽃을 선물하며, 이야기를 한다. “백합꽃 향기, 통학열차....기억 안 나요?” 하지만 남자의 마음처럼 여자는 기억을 되찾지 못한다. 오히려 원인 모를 간질 발작으로 여자는 쓰러져 침대에 눕기에 이른다. 남자는 의사에게 부탁을 하고서 누워있는 여자의 곁에 앉아 기억 저 편에 있던 그 시절 그 때를 이야기한다. 의사와 간호사는 남자를 걱정한다. 심부전을 앓고 끝내 심장 기능이 거의 멈춘 데다 소변의 양도 없다시피 함에도 여자 곁을 떠나지 않는 남자이다. 의사의 입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새어나온다. 결국 남자는 왜 자신을 두고 결혼을 했는지 제 슬픔 마음을 토로하였고, 여자는 또 다시 발작한다.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꼭...기억을 찾아야만 하나요?” 작품을 보는 어떤 관객들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지금이 행복한데 과거를 꼭 알아야 할까? 답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결말이 행복했든 아니었든 ‘나’와 그 어느 행복했을지도 모를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하다.
해피엔딩은 그 누구도 정의 내릴 수 없다
결과적으로 남자의 노력은 통한다. 여자는 기억을 찾았다. 그러나 그 대신 남자가 혼수상태에 빠진다. 이번에는 여자가 이야기한다. 남자가 몰랐던 지난 시절의 사실들과 제 마음을 토로한다. 그러나 결국 남자는 죽는다. 여자는 눈물을 흘린다. 생의 마지막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두 사람은 그렇게 또 이별의 순간을 맞는다.
이 작품은 그렇게 끝이 난다. 작품을 본 관객들 일부는 “해피엔딩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그들에게 다시 묻겠다. ”해피엔딩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해피엔딩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 단순히 생활이 풍요롭거나 안정적이어야만 ‘행복하다’말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 불행하지 않았다. 그 것은 남자뿐만이 아니다. 다시 홀로 남아버린 여자의 상황만 본다면 분명 누군가는 동정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녀에겐 무엇보다 남은 게 있다. 첫사랑이자 생에 끝 무렵 다시 찾아온 마지막 사랑의 ‘기억’이다. 해피엔딩은 그 누구도 제멋대로 정의 내릴 수 없다. 어떤 기억을 가진 그 사람만이 오롯이 그 기억을 평가할 수 있다. 추억 혹은 악몽으로.

삶에 지쳤는가? 당신. 지금 바로 뒤를 돌아보라.
이 작품은 단순히 아련하고 가슴 시린 첫사랑 혹은 마지막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각자 삶을 돌아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보인다. 옛 시절의 ‘첫사랑’이란 소재와 노년의 두 남녀라는 인물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일컬어지는 상황 설정은 주제 의식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요새 현대인들은 삶에 지쳐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작품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동시에 다시 한 번 그 ‘삶’을 붙잡으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물론 각박한 현대 생활에서 각자 나름대로 힘겨움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의지를 잃고 포기하는 데 있어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가난이든 실연이든 어떤 다른 것이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다양하듯 삶을 돌아보고 다시 의즤를 찾는 데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그 이유가 ‘사람’이자 ‘사랑’이었다. 가장 보편적이자 특별한 이유가 아닐까. 실제 극에서 남자는 아내의 자살로 하여금 약1년을 삶의 의지를 잃은 채 살아갔다. 그러다 결국 그녀를 만남으로서 의지를 되찾고,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데 남은 생을 모두 사용한다. 홀로 남은 그녀도 결국 ‘사람’을 만나 다시 삶의 생기를 찾았다. 남자는 없지만, 남자와의 기억은 그녀를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지탱해줄 새로운 원동력이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관객들을 향해 말한다.
“삶의 끝에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몰랐던 삶의 모습들이 보인다.”
사람은 바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앞으로 나아가기 급하여 뒤를 돌아볼 염두를 내지 못한다. 하지만 단 한 번 용기를 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다. “기적”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순간이 기적이 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삶’은 있지만, 그 “삶”이란 각자 개개인마다 다른 색을 띠고 있다. 다른 향기, 다른 기억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끝까지 진부하지만 진부할 수 없는 연극인 것이다. 관객들 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동시에 그 누구와도 똑같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을 떠올리도록 하기에 무엇보다 이 연극은 관객 개개인에게 특별하다. 극단 산울림의 <동행>은 오는 10월 3일까지 소극장 산울림에서 공연한다.
대학로티켓닷컴 기자단 김누리 kimnuri23@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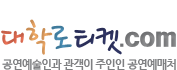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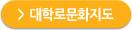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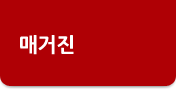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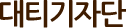
 이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