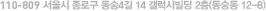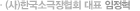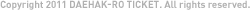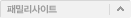매거진
대티기자단
매거진
대티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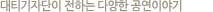
 프랑스풍의 광대 놀음을 보아라
프랑스풍의 광대 놀음을 보아라-
 최고 관리자
최고 관리자
 2012-08-21
2012-08-21
 10235
10235

지난 주, 휴가로 한국에 방문한 프랑스 친구에게 연락을 왔다. 자신의 사촌과 그녀의 남자친구도 한국에 놀러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우리는 약속을 잡아 만나기로 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컸지만 더불어 프랑스어 밖에 할 줄 모른다는 사촌커플의 이야기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 우리는 만나 카페에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 중 대학로에서 연극리뷰를 쓰는 내 이야기를 친구가 사촌에게 전해주었고, 요즘에 보았던 연극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가장 최근에 본 연극을 뭘 이야기 해줘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던 차에 나는 불현 듯 떠오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다.
“몰리에르, 스카펭!”
두 단어 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세 친구는 내 이야기를 용케도 알아듣고 흥미로워했다. ‘몰리에르’. 프랑스 희극작가인 그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름만으로도 대화가 통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순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바다를 건너와도 예술은 통하는 구나!

바쁘다. 바빠. 힘을 내요, 배우님!
이 연극을 보러 가는 길에 왠지 모를 기대감이 가득했다. 프랑스어를 전공이라고 배워놓고 내가 보았던 작품들은 하나같이 어려웠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든지, ‘코뿔소’와 같은 작품등의 심오하지만 정작 내용은 심오하지 않은 작품들을 많이 봤었다. 물론 연극사에서 충분히 중요한 작품들 이지만,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프랑스 문화가 어렵고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경향이 이런 작품들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나는 프랑스 예술의 진가는 희극에서 들어난다고 생각한다. 특유의 유머러스함이라든지, 연극을 이끌어 가는 재담이라든지, 한국 정서에서 크게 빗겨나가지 않으면서도 말 그대로 ‘희극’스러움이 담겨있다. ‘스카펭의 연극놀음’은 재기 넘치는 스카펭이 대책 없이 사랑에 눈이 멀어 결혼부터 해버린 두 도련님을 위해 주인님들께 결혼식 지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벌이는 소동을 다루고 있다. 스카펭이 연극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더불어 연극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으니 스카펭은 바쁠 수밖에 없다.
스카펭이 주인공이니까, 스카펭이 다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스카펭 이외에 4명의 배우가 모두 1인 2역 이상의 연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연극은 쉴 틈이 없다. 우스꽝스러운 뒷 세트로 들어가면 가발에 따라 혹은 자켓에 따라 역할이 바뀌는 배우들이 있다. 옥따브는 벽만 지났다 하면 레앙드르의 아버지가 되어있고, 반대로 레앙드르는 벽만 들어갔다 나오면 옥따브의 아버지가 되어있다. 늙은 노인과 패기와 재롱이 넘치는 청년사이를 오가는 배우들을 보고 있자면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날 지경이지만, 그 만큼 열정 넘치는 무대임은 틀림없다.

관객여러분, 크게 웃어 주쎄~요.
연극이란 현장성이 가장 큰 무기인 예술 형태이다. 관객과 배우가 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극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다. 벽만 있을 줄 알았던 무대 세트에서 배우가 다짜고짜 벽을 열어 보니,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등장했다. 그냥 한 템포 넘어가는 장면이었는데, 배우는 그냥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창 밖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아니 뭐 이렇게 밖에 사람이 많아! 관객석이 텅텅 비었는데! 와서 연극이나 보라구!! 하하하하” 그 대사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다 뒤로 넘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 꽉 차지 않은 관객석이 관객도, 배우도 멋쩍은 그 순간을 시원한 웃음 한방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다. 내 눈앞에는 그야 말로 중세시대에 시민극장에서 봤을 ‘연극’을 보여주는 광대들 5명이 있었다. 이 연극에는 일부로 웃음을 쥐어 짜내는 억지스러운 연기도 없고, 뛰어난 무대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연극의 맛을 보여주는 우스꽝스럽지만 사랑스러운 배우와 스텝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떼지 못했고, 극이 끝나고 아낌없이 박수를 쳤다. 이제 몇 일 남지 않은 서울공연과 몇 주 뒤에 있을 제주 공연까지 이 마음그대로 극단식구들이 좋은 공연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 황민정 (대티 대학생 기자단, mjh199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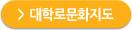





 이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