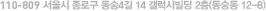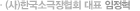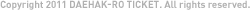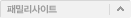매거진
웹진TTIS
매거진
웹진TTIS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 음악극 <백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 음악극 <백야>-
 최고 관리자
최고 관리자
 2012-04-12
2012-04-12
 6445
6445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 음악극 <백야>
김정미
극본 김영인
연출 최용훈
음악감독 이형주
공연기간 2012.2.18-2012.3.4
관극일시 2012.2.26 18:30
<백야>는 편한 작품이다. ‘뮤지컬’ 대신 ‘음악극’으로 불리기를 고집하는 작명법, 극장 로비를 채운 김좌진 장군의 사진자료, 비장함이 넘치는 포스터, “불의한 시대에 맞서 불꽃같은 삶을 선택한 백야 김좌진의 영웅적이며 극적인 삶”으로 요약되는 작품설명만으로도 이미 관객은 익숙함을 맛보며 안도하게 된다. 작품 속으로 녹아들기 전 감내해야 할 서걱함이나, 스토리 파악을 위해 요구되는 인지적(認知的) 부담도 없다. 미리 의도한 기획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삼일절을 앞둔 공연 시점 역시 관객들이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맥락을 두텁게 만들고 있었다.
<백야>가 편안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시감(旣視感) 때문이다. 이 연극이 참고 대상으로 삼았을지도 모를 <영웅>이 자동으로 연상된다는 말은 삼가더라도, 이미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 등을 통해 수 없이 반복되어 온 인물과 이야기와 갈등의 패턴이 거의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작품에서는 그런 패턴의 ‘변주’라고 부를만한 부분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너무나 솔직하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상대 앞에서 느낄 법한 민망함을 감출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보지 않아도 이미 본 것 같던 이 공연은 너무나 ‘뻔한’ 전개 속에서도 지겨움의 함정을 솜씨 있게 비켜간다. 갈등구조가 개인의 내면갈등을 넘어 인물 대 인물의 대결로 확장되지 못하고, 대립하는 인물 간의 대면조차 긴장도를 높이지 않으며, 가장 각광 받아야 할 주인공 캐릭터가 평면성에 갇혀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 등 드라마 측면에서 문제 될 부분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은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공연을 통한 감동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되짚어볼만한 일이었다.
무대가 열리면 신출귀몰한 의적 흑두건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로 술렁이는 저잣거리의 모습이 “굿뉴스.. 슬픔을 잊게 하는 흑두건 이야기...통쾌하고 신나는 굿뉴스..”라는 경쾌한 노래와 함께 역동적으로 펼쳐진다. 흑두건 사건은 일본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김좌진이 벌이는 일이다. 김좌진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떠나고, 흑두건 사건과 김좌진 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한 일본 헌병첩보부대의 하세가와 대좌는 그의 뒤를 좇는다.
한편, 청년 오민욱과 그의 연인 한은희는 독립군의 자제로서 살아가기 힘든 이 땅을 떠나 만주행을 준비하며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돕던 한은희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 후 민욱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하세가와의 첩자가 되어 김좌진의 북로군에 들어간다. 이 후 북로군의 훈련 장면과 인간미 넘치는 김좌진의 모습, 훈춘에서 발생한 조선인 양민 학살과 그에 따른 김좌진의 고뇌, 연인을 찾아 만주에 온 은희의 의지, 민욱의 유인으로 인해 마주하게 된 김좌진과 하세가와의 대결, 민욱의 죽음 등이 이어지며 스토리는 매우 ‘예측 가능한’ 방향과 방식에 따라 전개된다.
아쉽게도, 너무나 납작한 캐릭터로 그려진 김좌진은 고뇌하는 장면이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조차 교과서적으로 보였다. 오민욱이 겪었을 극심한 갈등은 그의 대척점에 서 있는 김좌진과의 폭발적인 부딪침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런 뻔한 전개와 얄팍한 갈등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무난한 곡들과 역동적인 회전무대 등 공들인 장면들에 힘입어 지루하지 않게 이어진다. 한성식(이치로 경시)의 감초같은 코믹 연기도 관객들이 무거운 주제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며, 문종원(하세가와 대좌)이 내뿜는 카리스마는 주인공에 버금가는 매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들의 캐릭터 역시 극의 전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각자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모습은 음악극스토리라인이 지닌 단순성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간휴식을 포함해 2시간이 조금 넘는 공연은 커튼콜 시간 출연자들의 애국가 합창까지 일관된 전형성을 보여주지만, 관객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한 정서에 힘입어 소위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특히 청산리 전투 후 시간의 흐름 속에 낡은 사진 한 장으로 남은 그들의 모습인 양 무대의 깊숙한 뒷면에서 스냅샷 장면을 연출한 것은 관객들의 가슴에 뜨거운 울림을 주는 뛰어난 전략이었다.
<백야>는 갈등의 층위를 따지고 캐릭터의 깊이를 따지기 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극의 구조와 부족하거나 과하지 않은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관객들에게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아는 작품이다. 하지만 무난함을 넘어 특색 있는 감동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울림과 갈등의 깊이를 조금 더 다듬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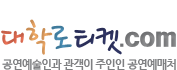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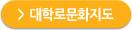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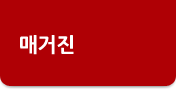




 이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