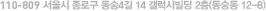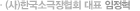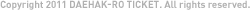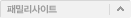매거진
웹진TTIS
매거진
웹진TTIS

 변두리극장
변두리극장-
 최고 관리자
최고 관리자
 2012-04-12
2012-04-12
 5812
5812
극작 : 카를 발렌틴
연출 : 오동식
상연일시: 2011.12.24~2012.01.22
상연장소: 게릴라 극장
관극일시: 2011.01.21.16:00
카바레트 드라마가 생소해도, 카를 발렌틴에 대해 모른다 해도, 변두리 극장의 관극평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통쾌하다’였다. 소통의 부재를 언어유희로 풀어내는 희곡이지만 공연과 관객의 소통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연희단거리패의 공연은 대부분 무대의 규모와 관극의 만족도가 꼭 비례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준다.
카바레티스트, 카를 발렌틴의 희곡을 ‘카바레트 드라마’라는 생소한 형식의 공연으로 펼쳐보인다. 카바레는 프랑스의 살롱 문화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정치, 사회, 일상의 시의성 있는 문제들을 노래와 풍자, 비판을 통해 웃음으로 풀어내는 공연예술이며 카바레트 드라마를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극장을 지칭한다. 카바레티스트는 대부분 카바레 텍스트 쓰기와 연기를 모두 맡는 다재다능한 예술가로서 날카로운 현실 인식과 예술적 능력을 동시에 갖춘 면모를 보인다. 카를 발렌틴은 찰리 채플린과 동시대인이며, 독일의 찰리 채플린, 연극계의 찰리 채플린이라 수사된다. 한국 외국어대 정민영 교수에 의하면 풍자적인 발렌틴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유머는 언어예술에 기초한다고 말한다. 발렌틴이 다른 유머 작가와 다른 점은, 어떤 주제를 핵심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방식이 아닌 그의 언어 자체가 주제를 제공하고 언어가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두리 극장>에서 재현되는 언어유희는 희극성을 최우선으로 점하고 있다. 자신만의 사고와 고집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물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야기시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웃음을 유발한다.
오동식 연출은 정민영 교수가 번역한 단막극, 막간극, 촌극 등 총 22편으로 이루어진 발렌틴의 희곡집 『변두리 극장』에 수록된 희곡 중 2막으로 이루어진 <변두리 극장>과 나머지 5편<웃기는 연애편지>, <극장에 갈 때>, <예쁜 말로 싸우기>, <제본공 바닝거>, <전쟁에 관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의 단막극을 중간 중간 삽입하여 총 일곱 편의 극을 한 편의 희곡으로 각색화했다. 각색의 어려움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오동식 연출은 새삼 각색의 중요성을 실감케한다. 한 세기도 더 지난 독일의 카바레트 드라마라는 공연을 ‘지금 여기’에서 펼쳐 보이며 관객에게 공감을 획득시킨 것은 뛰어난 연출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일곱 가지 에피소드가 비유기적으로 구성됐지만 이를 관통하는 중핵 사건은 변두리 극장 무대 위에서 지휘하고 연주하는 광대들의 이야기이다. 실제 관객들은 그들의 연주를 보러 온 극 중 관객으로 포섭되며 극 중 극 형식을 띠고 있다. 시초부터 관객은 연극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의 희곡에서 카를 발렌틴이 소화했던 역할을 지휘하는 광대, 딴지 거는 광대, 게으른 광대, 서투른 광대로 인물을 분산시키며 극의 재미를 더한다. 지휘자는 왜 지휘를 하는지, 단원들은 왜 심통을 부리며 지휘자에게 어깃장을 놓는지는 알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엉터리 악사들이 구석진 변두리 극장에서 연주하는 곡들은 ‘Nessun Dorma’, ‘Habanera’, ‘불타는 사랑’ 같은 가곡이다. 이는 당대 독일에서 유행했던 오페라 가곡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이는 변두리 극장 위의 인물들의 모든 삶과 언어 자체가 아이러니임을 비언어적으로 환기시킨다. 배우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 놓여있고 관객들은 그저 상황 속에 정신을 올곧이 내맡긴다. 사유가 틈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상황의 전개가 막장으로 치달아간다. 스프링 달린 신발을 신은 지휘자의 광적인 지휘 아래 연주되는 엉터리 악사들의 음악은 불협화음의 극치를 이뤄낸다. 이는 끝내 극장을 무너뜨리며 하나의 세계를 붕괴시킨다. 벽돌로 된 소품들이 무너져 내리며 먼지가 풀풀 나는 무대는 실로 그로테스크했다. 폐허가 된 무대 위에서 서서히 일어나 다시 연주를 시작 하는 배우들. 거창한 주제의식과 극적 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해도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 공연이었다.
카를 발렌틴은 부동의 세계인식을 전제로 상황을 연출한다. 비극적 세계관, 부정성이 그것이다. 그는 자본가를 비판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노동자도 비판하고 있다. 즉 인류 전체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환멸, 소통의 단절을 희화화한다. 즉 무거운 주제를 무겁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풀어내므로써 관객들은 씁쓸한 페이소스를 느끼게 된다.
현실의 탈피기제로 대중매체를 여가의 쉼터로 활용하고 싶은 대중들은 심각하고 비극적인 연극에 대한 선호보다는 개그 콘서트나 뮤지컬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한 현상들을 대중의 선정성과 통속성으로 폄하시킬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내재한 숨 막히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인식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의 문제들을 대중매체를 통해 잠깐의 고개돌림으로 유보하려한다. 하지만 <변두리 극장>이 주는 웃음은 애초에 고개 돌리게 만들지 않고 정면에서 비꼬고 쥐어짠다. 삶이란 원래 이런 것, 인간의 의사소통이란 본래 그런 것,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삶의 편린들을 연극은 직시하게 만든다. 공감은 그다지 거창한 형식에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다.
변두리를 무대로 살아가는 광대에게 주변부의 세계란 모르는 앎(unknown knowns)의 세계이다.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 상징적 질서나 언어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주체, 그러면서 때로는 스스로 자조하고, 희화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부 세계에 대해 욕망하고 흉내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광대가 아닐런지.
관극이 끝난 지 한참 뒤에도 잔영이 떠오르는 것은 배우 이승헌의 눈빛이다. 다른 배우들의 연기와 손수 악기를 다루는 연주도 훌륭했지만 이승헌의 연기는 단연 독보적이다. 연극배우의 연기는 에너지의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완급조절이 어렵다. 이승헌은 그러한 완급조절을 능수능란하게 해 낸다. 마임 연기부터 광란의 지휘 연기까지. 하얀 분칠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 주름과 표정, 눈빛은 단번에 관객을 사로잡는다. 몇 년 전, 처음 볼 때부터 기시감이 들게 한 배우, 언제나 무대 위에서 관객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 같은 배우, 스크린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배우. 이승헌에게는 연극배우라는 지칭 이외에 그 어떤 수사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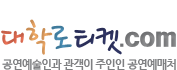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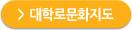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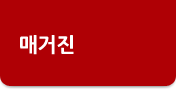




 이전
이전